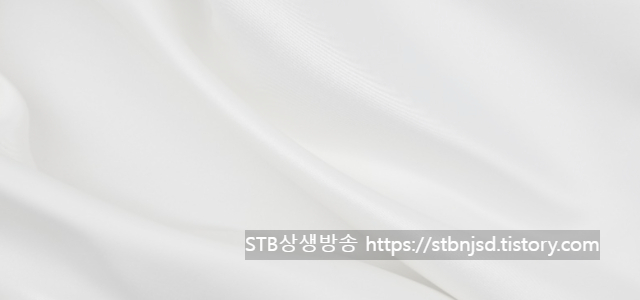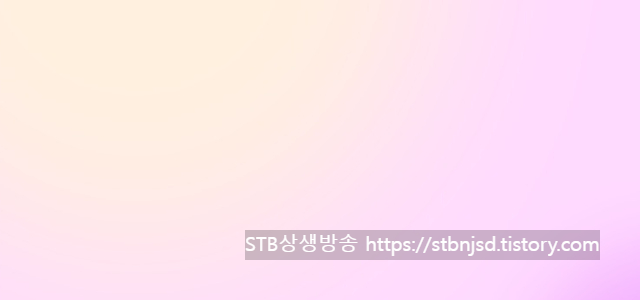존재는 둥글다(5) - 최상의 놀이(천부경, 태백일사)
상생문화연구소 황경선 연구위원
Ⅴ. 최상의 놀이
논의를 마무리 하며, 하이데거의 영역 문제와 관련하여 노자의 도道를 상기해 본다. 이는 둘을 비교하여 그들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각각의 것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서 시도된다.
| 도의 원래 의미는 ‘길’(Way)이다. ‘가르침’, ‘방법’, ‘원리’, ‘말’ 등의 파생적 의미들을 갖게 되는 것은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이르러 생겨난 변화라고 한다. 도의 ‘길’은 당연히 영역에 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그렇다. 모든 것들이 도 안에서 도로부터, 다시 말해 도를 중심으로 존재한다면 도는 이미 지평이나 장의 성격을 갖는다.(「A Comparative Study of Heidegger and Taoism on Human Nature」) |
노자는 도를 “유와 무가 상생하며 있는 것[有無相生]”(『노자』 제2장)으로 말한다. 이에 따르면 도의 영역은 ‘천지의 시작인 무’와 ‘만물의 어머니인 유’[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노자』 제1장) 사이의 ‘사이’, ‘사잇길’이 될 것이다.
노자는 또 그에 앞서 “유와 무는 같은 데서 나오며 이 동일성은 현이라 한다[此兩[有無]者同, 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노자』 제1장)라고 밝힌다. “유와 무는 같은 데서 나오고”에서 ‘같은 데’는 이미 장소적 개념이다. 그리하여 노자에게서 유무상생은 “지평적으로 순수 존재와 순수 무의 동일성과 변화를”(「Typology of Nothing: Heidegger, Daoism and Buddhism」)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자는 논리적인 의미와 무관한, 이때의 동일성을 ‘현玄’이라 부르고 있다. 현은 ‘깊고 심오한’, ‘깊어서 검은’이란 뜻인데, ‘깊이’나 ‘검다’는 말 또한 영역적 성격을 갖는다. 나아가 노자는 그 현을 ‘문門’[衆妙之門]이라는 보다 직접적 영역 개념으로써 표현하고 있다(『노자』 제1장). 현은 유무상생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또는 유래하는 ‘사이’ 혹은 ‘중심’ 영역[“같은 데”]인 것이다. 도는 결국 유무 사이의 시원적인 사이, ‘깊어서 검은’ 현인 신비한 골짜기[谷神](『노자』 제6장)이다.

하이데거 또한 노자의 시적詩的 사유에서 주도적 단어인 도는 본래 길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성’, ‘정신’, ‘근거’ 등 도에 대한 기존 번역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길[道]이란 말에는 아마도 사유할 가치가 있는 말함이라는 모든 신비 가운데 신비가 감춰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저 번역어들을 말해지지 않는 것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면 말이다.”(Unterwegs zur Sprache) |
한편 장자 또한 앞에서 인용한 바 있듯이, 만물이 길어 나오는 근원 자리인 무유无有를 역시 영역 개념인 ‘하늘의 문[天門]’으로써 설명했다.
유무상생의 사이나 중심으로 있는 도는 유도 아니며 무나 공도 아니다. 유 아니면 무 식의 형식 논리로 보면 도는 붙잡히지 않는다. 도대체 도를 무엇이라 규정할 때는 이미 도가 아닌 것이다[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그 때문에 도의 신비한 골짜기는 물리적으로나 산술적으로 구획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깊어서 검은’ 그 곳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유나 무를 낳는 선행 근거와 같은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도생일道生一’에서 ‘생生’은 도가 시간과 능력에서 앞선 원인으로서 일一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용과 같은 것이 아니란 얘기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논리로써 도에 앞서 도를 낳는 또 다른 ‘시작’과 ‘어머니’를 찾아 나서야 한다. 현, 즉 도는 언어가 미치지 않으며 근거만을 안중에 두는 논리적, 인과적 사유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감춘다. 그 점에서 현의 골짜기는 근거(Grund)를 거부하는 비非근거(Ab-grund)로서의 심연(Abgrund)이다. 도는 “심연[淵]”처럼 깊다.(『노자』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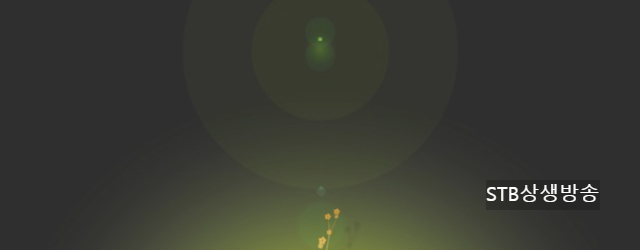
영역의 주제는 노자에게서 시적詩的 암시로 그치는 반면 하이데거에서는 보다 엄밀한 사유 속에서 다뤄졌다. 이제까지 영역에 대한 하이데거의 얘기는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존재 진리란 하나의 동일한 영역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존재자의 존재와 인간은 함께 속한다. 나아가 “동일한 것으로부터 그리로” 함께 속한다는 의미로 동일하다. 그리고 둘은 오직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는, 이 균형 잡힌 영역에서 비로소 각자의 참됨에 이른다.
이와 함께 존재의 존재자인 그 밖의 모든 것들 또한 존재 진리의 밝음 안에 감싸여 비로소 존재자로서 존재한다. 이로써 존재 진리의 영역[시공간] 안에서 그것을 통해, 말하자면 그것의 “마법”(Gelassenheit)으로써 존재와 인간, 그리고 그 밖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울리며 저의 참됨으로 돌아가 고요히 머무는 것이다.
이는 존재와 무, 존재와 존재자, 존재와 인간 사이의 영역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것, 즉 발현하며 영역화하는 하나의 존재 자체란 점을 지시한다.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열어 밝히며 내주는 심연으로서 벌여져 있는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그 하나이다. 그곳은 내 안에 있는 것도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이데거에서 모든 사유는 저 하나의 토포스로 향한다. ‘토포스’란 말의 어원은 창끝이라고 한다.(Unterwegs zur Sprache) 창끝은 모든 것이 하나로 몰려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토포스는 모든 것이 그리로 돌아가는 ‘끝’이자 그곳으로부터 길어 나오는 ‘시작’이다. 그것은 어떤 시작보다도 앞서고 어떤 마침보다도 뒤에 온다.
| 존재가 발현하는 토포스의 심연은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과 ‘일시무시일’의 일과 같다. 그것은 없지도 않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존재나 무마저 사라지는 그 곳은 깊고 검은 영역이며 신비한 골짜기[谷神]이다. “심연은 무도 공도 아니다. 검은[玄] 혼돈이다. 그것은 오히려 발현이다.”(Identität und Differenz) |
서구 시원의 그리스 사람들은 태초가 시작되는 혼돈(카오스)을 ‘하품’, ‘벌어진 간극’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하품이라면 우주의 하품인 셈이다. 창끝, 골짜기, 심연, 심지어 하품까지, 존재의 토포스를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V나 ▽ 형태의 영역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V, ▽는 ‘생명과 창조의 부호’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호명되든 존재 진리의 영역은 모든 것들이 비로소 그 자체로 머무는 때/동안, 즉 시공간이다. 우리는 앞서 이에 대해서 ‘die Heitere’의 오래된 의미를 통해 존재의 영역은 맑게 개이고 인간의 정동성情動性도 청량함과 시원함으로 조율돼 그리로 하나가 되는 ‘재색’의 시공간과 유비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천부경」이 수록된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 “소험유시 소험유공 인재기간[所驗有時 所境有空 人在其間]이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은 신령한 조화의 기운인 삼신三神에서 내려 받은 신성으로서, 삼신과 통하는 관문이 된다는 문맥 안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때 경험[驗]은 감각적이거나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을 찾아 우주의 실상을 자각하는 ‘깨달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험유시 소험유공’은 깨달음이란 모든 것이 참되게 들어서는 자각自覺의 장으로서 시간, 공간[시공간]으로부터 현성함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재기간’이란 참나로서의 인간, 본질로서의 인간은 저 깨달음이 일어나는 ‘동안의 폭’, ‘폭의 동안’인 영역에서[間] 유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도 토포스의 심연을 마주한다.
그럼에도 이 밝게 트임의 시공간은 형이상학에서 사유되지 않았다. 이는 존재 자체의 운명이지만, 형이상학 자체의 소홀함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형이상학에서 숨겨진 밝게 트임의 시공간은 형이상학이 줄곧 매달려온 근거 찾기의 사유방식으로써는 올바로 들어설 수 없다. 그것은 근거를 거부하는 심연이다. 당연히 마땅한 이름도 없다.
하이데거는 존재자들 가운데에서 어디에서도 그에 마땅한 보기를 찾을 수 없는, 숨고 드러나고, 나뉘고 속하는, 빛과 어둠이 투쟁하는 존재 진리를 ‘놀이’라고 불렀다. 놀이라면 모든 존재자의 존재가 걸린 유일무이한 최상의 놀이이다. 창끝이며 신비한 골짜기이며 둥근 원인,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의 일과 같으며 ‘태초의 하품’인, ‘놀이’란 말 외에 딱히 이름 부를 수 없는 심연은 비로소 세계가 세계로서 사물이 사물로서 들어서는 영역이다. 뜰에 잣나무가 피고 솔개 날고 물고기 뛰어오르는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고 죽는 곳이다.
**부기附記: 우리는 지금까지 영역을 다루는 모든 장에서 존재의 영역이란 시간이자 공간으로서 시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간략한 소개나 시사에 그쳤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는 시간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 여우가 물을 건넸는데 꼬리에 물을 묻힌 격이다. 이미 사유된 것은 아직 사유되지 않은, 그러나 긴박하게 사유되어야 할 것을 지시한다. 길은 끝나지 않았다.
우주변화원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증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생존의 비밀, 한민족과 증산도, 천지성공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 생존의 비밀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소책자 신청 링크★ http://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sunet3330
'동양철학(우주변화의 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삼일신고三一神誥」의 수행(1)ㅡ기혈,삼진,단군세기 (0) | 2022.10.17 |
|---|---|
| EBS창사특집 5원소 문명의 기원 소개.목화토금수 오행 (0) | 2022.10.11 |
| 존재는 둥글다 (4)-발현 혹은 심연,하이데거, 파르메니데스 (1) | 2022.08.17 |
| 존재는 둥글다(3) - 사방四方으로, 둥글게 트이는 존재 (2) | 2022.08.11 |
| 존재는 둥글다 (2)- 있는 듯 있지 않은 있는 것 같은 (0) | 2022.08.10 |